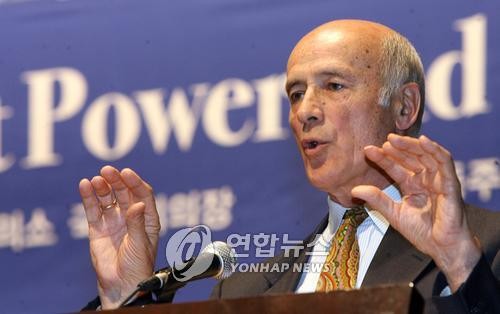|
소련 해체 후 미국을 견제할 세력으로 떠오른 중국은 나이의 이론에 주목했다. 군사·경제·인프라 등 하드 파워에서 밀렸던 중국은 '중화 부활' 해법 중 하나로 소프트 파워를 택했다. 약점을 보완할 동안 비교우위를 가질 강점을 만들어야 해서다. 선도국이 되려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중국의 가치나 제도가 매력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나이의 조언을 경청했다. 실제로 나이는 생전 중국을 적지않이 찾았다. 특히 소프트 파워가 통일전선전술과 맥이 닿는다는 점은 더 매력적이었다. 마오쩌둥(毛澤東)의 교리인 통일전선은 지금도 중국 공산당에서 필살기로 여겨진다. 소프트 파워의 변주곡인 샤프 파워는 문화·역사·가치·지식 등을 전파해 상대국 또는 적국의 정신문화·체제 등 무형 전력을 약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상대국 중 주적은 미국이다.
중국 전문가인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이를 경계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이들 경계론자에 따르면 샤프 파워는 정보를 왜곡·조작해 상대국 내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체제 불신을 키우는 방법 등으로 실현된다. 1억명 가까운 공산당 네트워크를 각국 재외국민과 온라인을 기반으로 연결해 이런 활동을 벌인다고 한다.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 상대국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대로 한 포섭과 친교 활동도 주요 목표라고 경계론자들은 설명한다. 예컨대 한반도와 만주 일대 등지의 역사를 왜곡하는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대표 사례다. 공자학원이나 각종 친중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다. 이런 전술은 열린 민주사회가 아닌 일당독재 정부만 쓸 수 있는 카드다. 정부 안에서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 하며 절대 내부 폭로가 나와선 안 되기 때문이다. 군사적 행위와 비군사적 조치를 적절히 안배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 개념이 갈수록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중국의 샤프 파워 전술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
lesli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