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데뷔 20년처 배우 박보영(35)이 '미지의 서울'로 또 성장했다.
tvN 토일드라마 '미지의 서울'(이강 극본, 박신우 연출)은 얼굴 빼고 모든 게 다른 쌍둥이 자매가 인생을 맞바꾸는 거짓말로 진짜 사랑과 인생을 찾아가는 로맨틱 성장 드라마. 박보영은 극중 미지와 미래 쌍둥이를 연기하면서 1인 2역을 넘는 1인 4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박보영의 열연에 힘입어 '미지의 서울'은 첫회 3.6% 시청률로 출발, 두 배가 넘는 시청률 상승세를 보여줬다.(닐슨코리아 유료가구 전국기준) 특히 화제성 면에서도 선전하면서 전체 드라마 중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미지의 서울' 속 미지와 미래는 박보영의 '인생 캐릭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인 2역을 넘어서 1인 4역을 소화해냈다는 호평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보영은 "저는 모든 작품을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데, (이번에) 두 배로 한 것에 대한 것은 있지만, 제 나름대로 그냥 기분은 매번 했던 것만큼 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응이 조금 남다르다. (팬들의 반응에) 살짝 얼떨떨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사실 감독님이 편집본 1화를 보면 좋겠다고 하셔서 본 적이 있다. 감독님은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하신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졌었다. 제가 가장 걱정한 것이 '그냥 박보영이네' 이렇게 보이는 것이었다. 미지와 미래로 보여야 하는데, 박보영1, 박보영2처럼 보이는 것이 컸다. 제가 스스로 낼 때의 목소리와 송출되는 목소리가 달라서 당황을 했다. 제가 생각했던 두 인물의 차이가 좀 덜 나보여서 당황했는데, 편집본을 보고 조금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차이를 둬야지 뒷부분에서 차이가 더 커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집본을 본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다. 나중에는 미지와 미래가 따로 보인다고 말씀해주신 것이 제일 컸다"고 했다.
'미지의 서울'은 이 세상에 사는 미지, 미래, 그리고 호수, 세진 등 모든 인물을 닮은 시청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힐링 드라마'로 자리잡았다. 박보영 역시 '미지의 서울'을 통해 위로받았던 시청자들과 마찬가지로 연기를 하며 치유가 됐다는 말을 남기기도.
|
"제가 대본을 보면서 앞부분에서 위로를 받은 것은 미지가 미래에게 '관두지도 말고, 버티지도 마. 대신 해줄게'라는 말이 제가 듣고 싶은 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할머니(차미경)의 대사도 좋았다. '할머니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우리 미지 나비가 되려고 이렇게 힘드냐. 소나기가 무서워서 숨으면 그게 잘못된 거냐. 다 살자고 하는 건데, 다 용감한 거야'라고 해주시는데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 살면서 후회하는 것들이나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선택들이 당시에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던 것 중에 최선이었으니 선택을 한 거잖나. '후회만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했던 선택에 대해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저는 엄청 크게 와닿았다고 생각한다. 내레이션에서도 '동그라미가 쳐졌다고 다 안 게 아닌데, 틀렸으니까 제대로 푸는 날도 올까'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야기는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되게 별로로 보일 수 있어도 그래도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어쩌면, 좋아 보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모두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을지언정 '네가 열심히 살면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다."
팍팍했던 첫 서울살이까지, 미지는 박보영과 꼭 닮았다. 박보영은 충청북도 괴산 출신으로 연예계 생활을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 '미지의 서울' 속 미지와 비슷한 삶을 살아왔다고. 박보영은 "시골에 있을 때에는 서울이란 휘황찬란한 동네였다. 항상 높은 빌딩이 있고, 저희 동네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있었다. 예전에 이모가 서울에 사셔서 서울에 한 번 갔을 때 지하철이 너무 신기했다. 그래서 방향도 잘 몰라 잘못 탄 적도 있었는데, 저에게 서울이 약간 미지의 세계 같은 느낌이었다. 서울에 와서 일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녹록치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지의 마음을 더 많이 느끼고, 저 스스로 그래서 대본을 더 재미있게 읽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박보영은 "제일 녹록치 않았던 것은 사색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시골에서는 그냥 제가 사색을 하면서 걸을 수 있는 공간도 많았고, 조용히 있을 공간이 많다고 생각했다. 조용하니까 조용한 곳을 일부러 찾지 않아도 되는데, 서울에서는 조용한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달랐다. 제가 미지처럼 한강을 좋아했는데, 예전에 제가 엄청 힘들었을 때 한강공원에서 엄청 울었던 경험이 있다. 이게 힘들거나, 펑펑 울고 싶으면 가는 스폿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털어내고 오는 편이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에는 털어내러 간다고 생각해서 가면, 또 '그때만큼은 아니지 않나? 강해져야지. 이 정도로 오지 말자'고 스스로 다독이는 장소가 됐다"며 웃었다.
|
마냥 밝고 귀여운 '뽀블리' 이미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지만, 이를 지켜나갈 예정. 박보영은 "밝은 이미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 한 2년 정도는 밝은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것도 걱정을 했다. 그래서 어두운 느낌의 캐릭터를 하려고 노력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캐릭터도 밝지만, 우울증을 앓는 친구이기에 그런 부분에서 갈증을 채우려고 선택하기도 했다. '미지의 서울'도 사실은 미지가 밝기는 하지만, 그 친구도 아픔이 있는 친구여서 노력을 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요즘에는 밝은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든다. 요근래 내 평균이 조금 내려간 느낌이 든다. 드라마도 차분한 작품을 하다 보니 좀 내려갔나 싶기도 하고, 제가 뭐라고 자꾸 메시지를 드리나 싶다. 메시지는 이제 많이 드린 것 같아서,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제가 지금 촬영 중인 '골드랜드'는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어두운 것인데, 이 다음엔 밝은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보영은 '뽀블리'라는 수식어에 대해서도 "오래 가져가고 싶다.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라는 걸 너무 절실히 깨닫고 있다. 정말로 이걸 좋게 봐주시기에, 잘 유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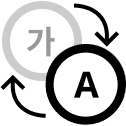



![[SC인터뷰] "한강서 펑펑 울며 '강해져야지'"..'미지의 서울' 박보…](https://www.sportschosun.com/article/html/2025/06/30/2025063001002078600291541_w.jpg)
![[SC인터뷰] "한강서 펑펑 울며 '강해져야지'"..'미지의 서울' 박보…](https://www.sportschosun.com/article/html/2025/06/30/2025063001002078600291542_w.jpg)
![[SC인터뷰] "한강서 펑펑 울며 '강해져야지'"..'미지의 서울' 박보…](https://www.sportschosun.com/article/html/2025/06/30/2025063001002078600291543_w.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