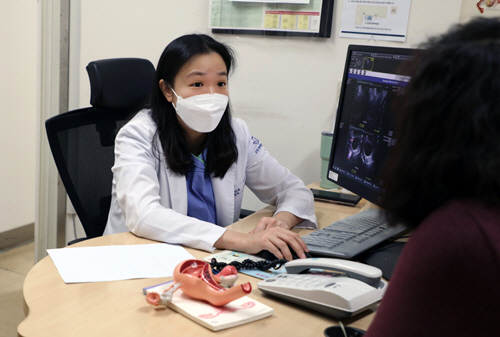새해가 밝은 만큼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혹시나 아기에게 장애가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산부인과 편승연 교수와 함께 임신 기간 중 시행하는 산전 선별 검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초음파, 혈액검사를 통한 선별검사로 염색체 이상 가능성 확인
산모의 피에서 호르몬 수치를 검사하는 혈액 검사는 1분기에 하는 b-hCG, PAPP-A, 2분기에 하는 트리플검사, 쿼드 검사가 있다. 혈액검사를 통해 다운증후군을 포함한 염색체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다양한 검사를 통해 염색체 이상의 발견율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군이면 확진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NIPT 등 산모 혈액 내에 존재하는 세포유리태아 DNA를 검출해 검사하는 cell free fetal DNA 테스트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이 나왔다고 다 염색체 기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저위험군이라고 무조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선별검사 고위험군, 확진검사로 정확히 확인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이 나온 경우, 또 다른 선별검사를 하는 것 (특히, NIPT등)은 염색체 이상의 진단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침습적 확진검사를 하고 싶지 않은 경우 cell free DNA 검사를 시행할 수는 있으나, 확진검사를 시행하는 시기를 늦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별검사 고위험군이 받는 확진검사는 10~12주에 할수 있는 융모융모막검사(CVS), 16~20주에 할 수 있는 양수검사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배에 주사바늘을 찔러 융모융모막이나 양수에 있는 아기의 세포 체취하여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세포에서 염색체 수적 이상을 확인하는 염색체 핵형검사를 먼저 진행한다. 검사를 통해 태아의 염색체부터 유전자, 신경관결손, 감염, 폐성숙 등 다양한 부분의 이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확진검사 반드시 하는 것은 아냐, 선별검사 고위험군이면 권고
확진검사는 염색체 이상 여부를 확진할 수 있지만, 검사 방법이 침습적이다. 보통은 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나타나면 확진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편승연 교수는 "예를 들어 35세 임신부가 출산 시 다운증후군일 확률은 385명 중에 1명이며, 어릴수록 낮아진다. 통합검사를 하는 경우 다운 증후군의 발견율은 96%까지 증가한다. 고령 산모이거나 목둘레 투명대가 두꺼웠던 경우에서는 선별검사에서 다운증후군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의료진으로부터 선별검사의 종류와 장단점, 확진검사의 장단점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20~24주 정밀 초음파 검사 시 이상 발생하면 추가 검사 권유
최근에는 추가로 염색체의 미세결실이나 중복을 검사하는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상적으로 염색체는 총 46개인데, 각 염색체의 미세한 염기서열 일부가 없어지기도, 중복되기도 하는 현상이 염색체 미세 변이이다. 염색체의 미세한 변이만으로도 디죠지신드롬(22번 염색체의 일부 결실이 있는 유전병)과 같은 기형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미세결실과 중복이 반드시 질병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며 마이크로어레이검사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반드시 해야 하는 검사는 아니다.
편 교수는 "향후 20~24주에 진행하는 정밀초음파에서 심각한 구조적 기형이 보이거나 염색체 이상 태아에게서 발견되어 주의가 필요한 소견(낮은 코, 맥락총 낭종, 심장내 고에코 부분 등)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확진검사와 마이크로어레이검사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