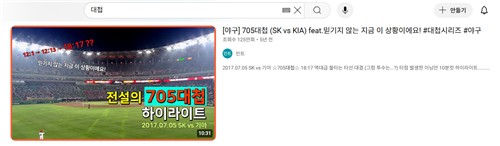|
|
|
|
|
|
"허용 여부 따지기보다 일상화 배경 분석해야"
"단어 뜻 시대 따라 변화"…"언어는 유연하게 바라봐야"
(서울=연합뉴스) 최혜정 인턴기자 =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vs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비슷해 보이지만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은 하나뿐이다. 정답은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는 말 그대로 상대방더러 '한가위'(추석)가 되라는 뜻으로, 어법상 올바르지 않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만큼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도 많이 쓰인다. '맞는 말'과 '통하는 말'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언어 규범의 숙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언어의 본질이 '소통'에 있는 만큼, 문법보다 의사 전달의 자연스러움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한가위 된 사람?
추석연휴 직후인 지난 10일 국립국어원은 온라인 질의응답 코너인 '온라인 가나다'에서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는 잘못된 표현입니까?"라는 질문에 "생략된 주어가 상대이므로 '보내세요'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되세요'를 서술어로 쓴다면 주어와 호응이 맞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어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
오규환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어법은 기본적으로 따르는 게 좋지만, 그것은 의사소통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어법에 맞지 않으니 쓰지 말자'고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줄어든다"고 짚었다.
예컨대 어법상으로는 '커피를 끓이다'보다 '물을 끓여 커피를 만든다'가 더 정확하지만 실제로는 전자가 더 자연스럽게 쓰이는 것처럼, 어법에는 다소 어긋나더라도 맥락상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그런 맥락에서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이라며 "언어는 유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태린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한가위 되세요'의 허용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왜 이런 표현이 일상적으로 쓰이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분석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유명세 타다"·"황망한 죽음"…뜻이 뒤집힌 말들
이렇듯 언어 규범과 실제 사용 실태 사이 간극은 벌어져 있다.
대표적으로 '유명세'와 '장본인'은 본래의 부정적 의미가 희석된 채로 오용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유명세'란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탓으로 당하는 불편이나 곤욕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세'(稅)는 세금의 의미로, '유명세를 치른다'는 말은 '유명함 때문에 치르는 대가'를 뜻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유명세를 누리다', '유명세를 타다'처럼 긍정적인 의미로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다. '고생값'이 '인기 보너스'로 뒤바뀐 것이다.
또 '장본인'은 '어떤 일을 꾀하여 일으킨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 사달을 일으킨 장본인은 김강보였다'처럼 부정적 맥락에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탄생 장본인', '기적을 만든 장본인' 등 긍정적인 의미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황망하다', '대첩'처럼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 쓰이는 사례도 있다. '황망하다'의 원래 뜻은 '마음이 급하고 허둥지둥하다'로, '그는 약속 시간에 늦어 황망하게 밖으로 나갔다'가 정확한 쓰임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황망한 죽음'이라는 표현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고 슬프다'는 뜻으로 오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확히는 '황망한 죽음' 대신 '허망한 죽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대첩은 '싸움에서 크게 이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싸움이 끝나 승패가 갈린 상황에서 쓰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서 벗어나 '큰 싸움'을 의미하는 '대전(大戰)'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잦다.
다만 이러한 '혼란'에 대해 단어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틀렸다고 단정하기보다 바른 표현을 권장하는 수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립국어원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역사로 대대로 남을 급'을 의미하는 '역대급'처럼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도 있다. 아직은 표준성을 획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2008년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에 등재된 '왕따'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표준어로 등재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 "짜장면을 왜 짜장면이라 부르지 못하나"…반발 수용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은 이러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어문 규정을 현실화해 왔다.
대표적인 예시가 '자장면'이다.
국립국어원은 1986년 외래어 표기법을 고시하면서 '짜장면'은 틀린 표현이라며 '자장면'만 표준어로 삼았다.
'짜장면'의 어원은 '볶은 장을 얹은 면'이라는 뜻의 중국어 '炸醬麵(zhajiangmian)'으로, 외래어 표기법에서 'zh'음을 'ㅈ'으로 적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1950~1980년 내내 일상적으로 사용돼 온 '짜장면'이 비표준어가 되자 대중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현행 규칙이 오히려 언중에게 불편을 준다'는 학계의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짜장면 표준어 인정안은 국어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후 2011년 8월 국립국어원은 '짜장면'을 '자장면'과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했다.
또 본래 '주책이다'도 비표준어였다. '주책'의 본뜻은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으로, 긍정적인 의미였다. 따라서 '일정한 줏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해 몹시 실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책없다'로 표현해야 했다.
그러나 많은 이가 '주책이 심하다' 등 '주책이다'를 '주책없다'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립국어원이 '주책'의 의미로 '일정한 줏대가 없이 되는대로 하는 짓'을 인정함에 따라 2016년에는 '주책없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주책이다'가 표준형으로 인정됐다.
이 외에도 2015년 국립국어원은 '이쁘다'(예쁘다), '잎새'(잎사귀) 등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비표준어였던 단어들을 표준어로 인정했다. 급변하는 언어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언어생활의 편의를 높이고자 어문 규정을 현실화한 것이다.
어휘 사용 실태 조사와 말뭉치 검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들을 선별한 결과다.
동시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는 없애기도 했다.
국립국어원은 2020년 온라인가나다를 통해 '돌'은 생일, '돐'은 '주년'의 뜻으로 구분해 써 왔으나 구별이 인위적이고, 현실적으로 '돐이'·'돐을'을 각각 [돌씨]·[돌쓸]로 발음하지 않으므로 '돌'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았다고 밝혔다.
haemo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