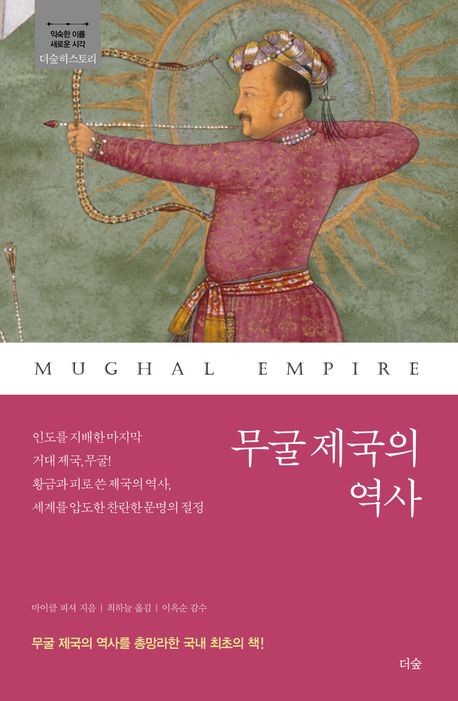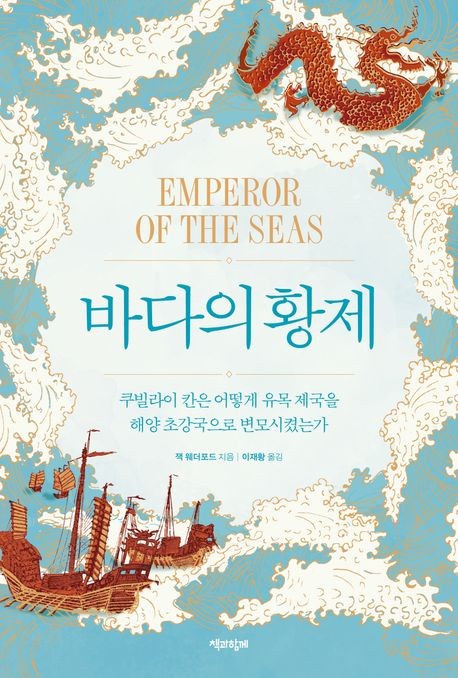|
|
|
무굴제국을 열어젖힌 바부르의 모친은 칭기즈칸의 차남 차가타이의 후손이고, 부친은 티무르의 직계였다. 바부르는 선조들처럼 이슬람교를 받아들였지만, 몽골의 유산을 잊지 않았다. 제국을 지탱하는 기틀은 야사(몽골제국의 법)와 퇴레(관습의 총체)였다. 군사 체제도 몽골의 것을 그대로 유지했다. 몽골 기마대는 바부르 군대의 양 날개에 배치돼 전장을 이끌었다.
바부르의 손자 악바르 대제 시절 때 크게 번성한 무굴제국은 자한기르와 샤 자한이 통치한 17세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초강대국으로 성장했다. 무굴제국의 인도는 당시 세계무역의 중심지였고, 유럽보다 인구가 많았다. 당대 인도는 풍성한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선두권으로 도약했다.
그 부(富)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인도하면 떠오르는 관광지 '타지마할'과 델리의 붉은 요새, 아그라 요새 등 인류의 유명 문화유산이 이 시기에 건립된 걸작들이다. 저자는 이 같은 무굴제국의 경제적·문화적 발전과 함께 빈번한 섭정 등으로 제국이 쇠락해 가는 과정도 함께 살펴본다.
몽골이 육지에서만 힘을 쓴 건 아니었다. 바다에서도 강했다.
잭 웨도포드 미국 매칼리스터대 석좌교수가 쓴 '바다의 왕자'(책과함께)는 몽골제국 5대 칸(몽골의 황제)이자 중국 원나라를 세운 쿠빌라이 칸을 조명한 역사서다. 저자에 따르면 칭기즈칸의 손자인 쿠빌라이는 유목 제국의 후계자이면서도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해양 제국을 설계한 지도자였다.
그는 무(武)를 숭상했던 몽골 왕족 또래들과는 달리 학문을 공부하고 토론하길 즐겼다. 형 뭉케의 뒤를 이어 칸이 된 후 쿠빌라이는 고려 기술자들을 시켜 선박을 제조하게 했고 수군, 무기, 의학 등 남송의 여러 지식을 수용해 수군을 새로 편성했다.
아울러 기존 조공 중심 재정을 상업 기반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지폐를 발행해 통화 시스템을 효율화했다. 무엇보다 인재 등용에 적극적이었다. 중국인, 아라비아인, 유럽인 등을 가리지 않고 등용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강에 의지해 간신히 버티던 남송은 수군까지 갖춘 몽골군을 결국 당해내지 못했다. 양쯔강을 건넌 몽골군은 파죽지세로 남송을 유린했다.
그렇다고 쿠빌라이의 해군이 불패의 수준에 이른 건 아니었다. 일본, 베트남, 자바 등을 침략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저자는 기후, 낯선 자연환경 탓에 원정에 실패했지만, 쿠빌라이가 이룩한 해상전력은 상업 발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분석한다. 특히 해상 함대를 바탕으로 러시아 사할린 앞바다에서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이르는 방대한 해로를 개척하고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몽골이 강력한 함대를 바탕으로 무역망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커다란 경제적 부를 쌓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 무굴제국의 역사 = 최하늘 옮김. 498쪽.
▲ 바다의 황제 = 이재황 옮김. 464쪽.
buff27@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