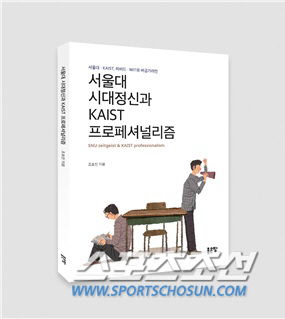|
신간 '서울대 시대정신과 KAIST 프로페셔널리즘'의 저자 조호진은 1990년대 물리학 전공으로 서울대(석사·박사)와 KAIST(학사)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대학의 문화가 매우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 책을 기획·집필하게 됐다.
저자는 서울대는 군부독재 시절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시대와 함께 호흡했던 '시대정신'을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KAIST는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설립돼 이에 보답하기 위해 오로지 공부와 연구만으로 점철된 '프로페셔널리즘'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포스텍 물리학과 염한웅 교수를 예로 들었다. 염 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 85학번이다. "염 교수도 대학 시절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다. 염 교수는 1987년 12월에 기말고사를 준비하지 않았다. 당시는 16년 만의 직선제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온 국민의 관심이 뜨거웠던 시기이다.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진 군부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려면, 야권의 김영삼·김대중 두 후보의 단일화가 절실했다. 4학년생이었던 염 교수는 동기, 후배들과 함께 민주당사를 점령해 단일화를 요구했다."(본문 발췌)
저자는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는 문구가 동시에 떠올랐다고 한다. 저자는 KAIST의 대전을 떠나 서울대에 오면서 해당 문구를 처음 들었다고 한다. 첫 느낌은 '재수 없다'였다고 한다. 대한민국에 서울대만 존재하는 냥 해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재 정권 시절의 엄혹한 세월에 자신에게 담보된 미래의 영광과 조국의 민주화를 맞바꾼 서울대생을 숙고하면, 정당한 자부심의 발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저자는 KAIST의 프로페셔널리즘 역시 사례로 들었다. KAIST에는 선행학습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내 친구들은 방학 중에도 스터디모임을 했다. 전공과목으로는 부족하다거나 다음 학기에 들어야 할 전공과목을 위한 간단한 책을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마치 고등학교 시절 수학 정석을 한 학기 미리 공부하는 모습이었다." (본문 발췌)
공부의 양에 있어서는 KAIST가 서울대보다 훨씬 우월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상응하지 못한다는 것,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는 원동연 KAIST 교수가 하버드대에서 노벨상 수상자들과 지냈던 경험담에서 원인을 찾았다. 원 교수는 "다만 그들은 노벨상을 받을 분야를 연구했고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시대의 필요가 무엇인지, 시대를 흔들 연구 분야가 무엇인지 알고 뛰어들었다면, 우리는 그냥 열심히 했다는 점이 노벨상 수상자와 우리를 갈랐다."(본문 발췌)고 말했다. '시대정신'의 함양이 필수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과 같다.
필자는 KAIST가 지닌 한계를 세계 IT 동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 자체로는 캘리포니아공대(CalTech), MIT 학생들이 하버드대 보다 뛰어날 수 있다. 하지만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시대를 지나자,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의 구글로 이어졌다. 구글 천하 시대가 오는 가 싶었는데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이라는 신대륙이 등장했다.
저자는 이중 하버드 중퇴생이 둘이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게이츠와 저커버그이다. 페이지와 브린 역시 종합대학인 스탠퍼드 대학원을 중퇴했다.
'서울대 시대정신과 KAIST 프로페셔널리즘'은 신기원을 이룬 기업 경영에서마저도 시대정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제 두 대학의 장점을 분석했으니,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KAIST에 공부를 더 시키기보다는 시대정신의 함양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면 제3세계의 체험을 필수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연한 지식을 우리보다 못사는 지역에서 나눌 때 삶의 인식도 새로워지고, 획기적인 연구 성과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구조적으로 서울을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과 과대포장의 서울에서 학문의 본산이 되라는 요청은 수도승에게 도심에서 세속에 영향 받지 말라는 요구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예로 서울대 정치학과가 1995년이 돼서야 최초의 정년퇴직한 교수를 배출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또한, 2000년 이후로 서울대의 강점이 시대정신이 급속하게 약화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서울대가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하면, 소외된 지방의 한계를 몸소 체험하게 된다. 서울대가 지방으로 가면 약자의 고통을 구조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서울대가 서울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스스로 포기하면, 서울대 구성원들은 위기의식에 쌓일 것으로 예상했다. 위기의식이 발동하면 발전적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대는 고통스럽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로는 이득이다. 더 이상 아침 해를 맞이하듯이 줄 세우기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수혈받는 서울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는 세종시가 서울대 이전의 적합한 지역이라고 말한다. 종합대학인 서울대가 세종시에서 학문에만 매진하면 하이에크, 칸트 같은 대학자를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통일한국의 미래'같은 민족의 담론을 굳이 외국의 학자에게 자문하는 촌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대주의를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은 허장성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조선일보에 입사해 기자로 활동하면서 과학 분야를 수년간 다뤄온 저자 조호진은 "KAIST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더 시키기보다는 시대정신의 함양을 필수로 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면 제3세계의 체험을 필수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당연한 지식을 우리보다 못사는 지역에서 나눌 때 삶의 인식도 새로워지고, 획기적인 연구 성과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라며 이외에도 두 대학이 보완해야 할 점들을 여러 방향에서 제시하며 이 책을 끝맺고 있다.